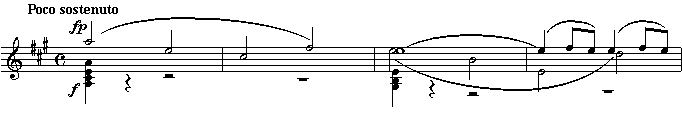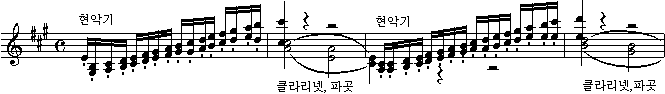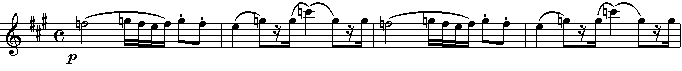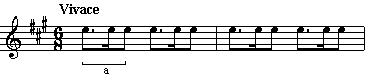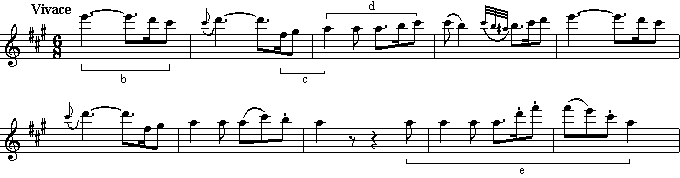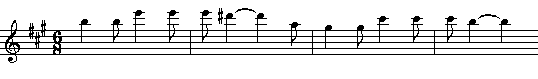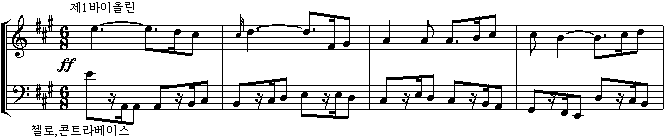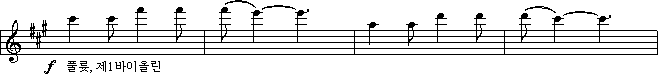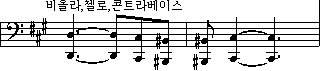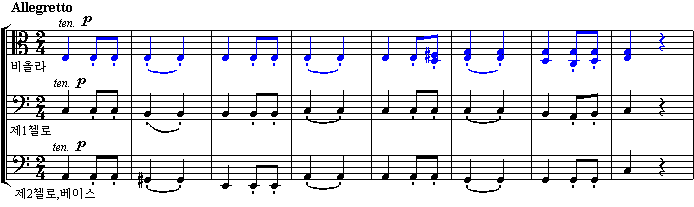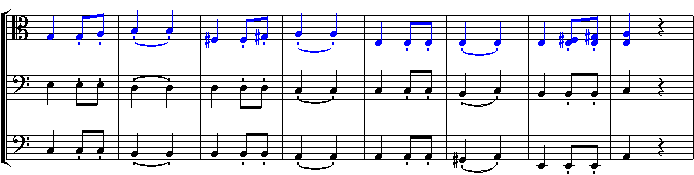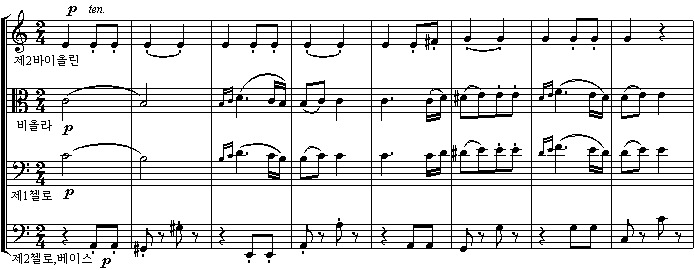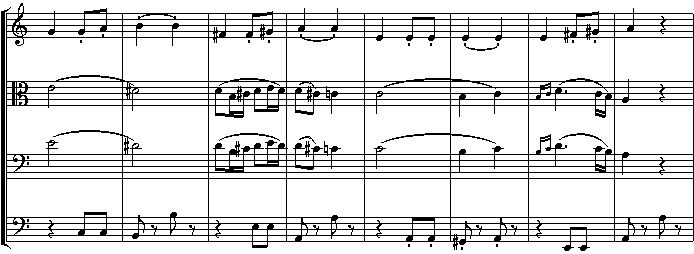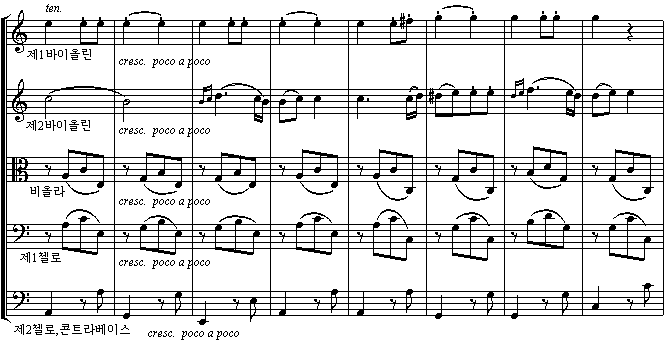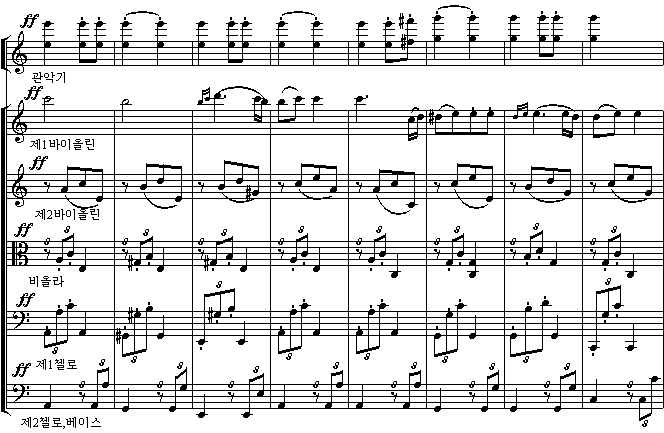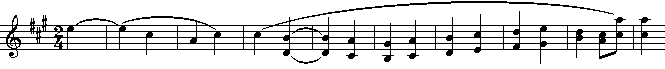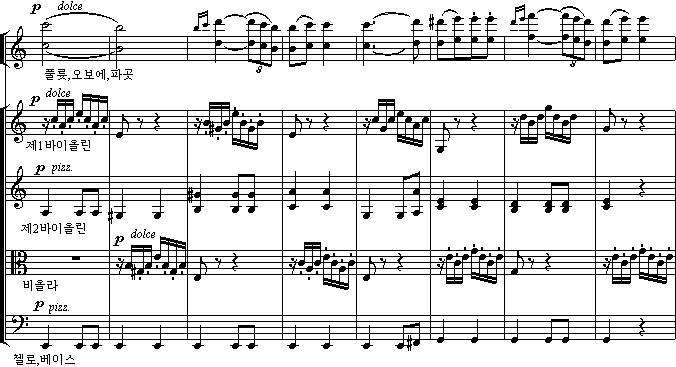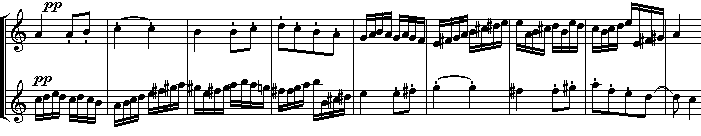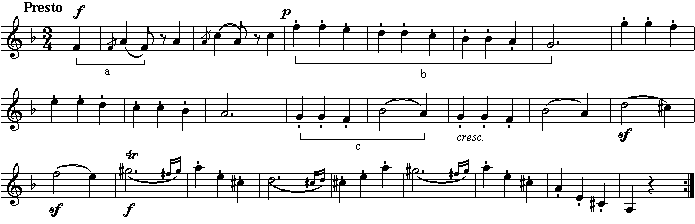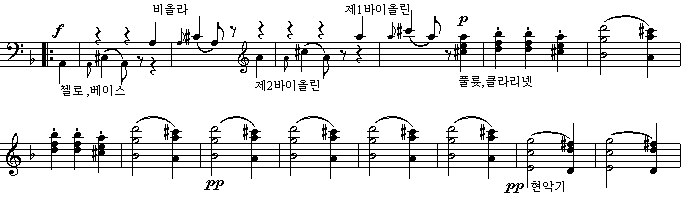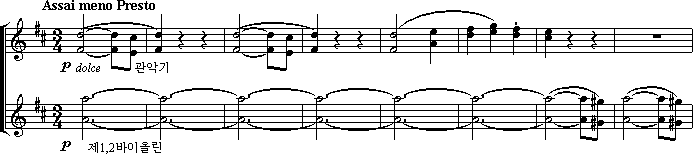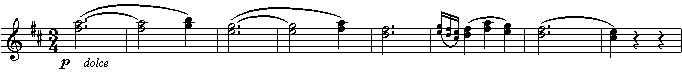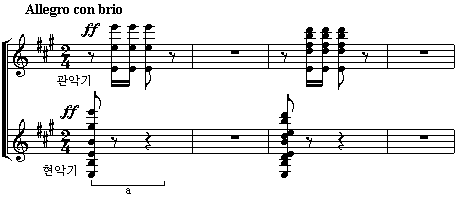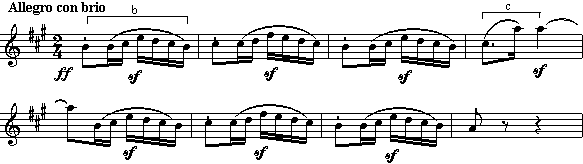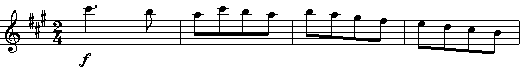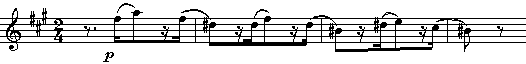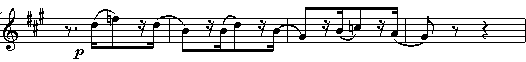이 곡은 베토벤 중기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향곡 제5번과 제6번, 그리고 후기에 속하는 교향곡 제9번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으며 교향곡 제8번과 함께 과도기에 위치하는 작품이다. 베토벤의 9개 교향곡중 별명이 붙어있는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다하겠지만 교향곡 7번은 베토벤 교향곡을 하나만 꼽으라는 설문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보일 만큼 클래식 음악을 본격적으로 듣는 이들에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이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제1번을 제외하고는 짝수 번호 교향곡(2,4,6,8교향곡)은 경쾌우미하고, 홀수 번호 교향곡(3,5,7,9교향곡)은 호탕웅대하다고 한다. 분명히 홀수인 이 7번 교향곡에는 운명을 걷어차 버리는 듯한 씩씩하고 강렬한 에너지의 폭발이 보인다. 베토벤 성격의 일면으로서 자주 논의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베토벤은 일찌기 "나는 인류를 위해 좋은 술을 빚는 바커스(술의 신)이며 그렇게 빚어진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해준다"라고 했다하는데 그의 수많은 걸작중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그의 7번 교향곡이다. 정말로 곡을 듣고 있노라면 예외없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또한 술에 취했을 때마냥 용기에 넘치는 힘을 느끼게 해주는 불가사의한 곡이다. 이곡의 1, 4악장을 가르켜 베토벤이 술에 취해서 작곡된 것이 아닌가 하고 훗날 슈만의 아내 클라라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가 비꼬았다고 하는 데 이는 '술은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틀리듯이 어리석은 비평이 아닐 수 없다. 이말을 돌리면 건강한 취기를 용납할 수 없는 앞뒤로 꽉 막힌 분이라면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을 좋아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는 예측은 가능하다.
음악의 규모와 형식면으로 보면 교향곡 제5번과 제6번에서는 샘솟는 창작력으로 인해 종래의 형식이나 편성에서 보다 자유스럽고 발전하려는 느낌이 있음에 비하여, 교향곡 제7번에서는 원숙함과 고전적인 균형감 속에 풍부한 내용을 넘치도록 담고 있다. 악기 편성도 보통의 2관 편성이고, 형식적으로도 정규의 소나타와 거의 같으며 제1악장에서는 느리고 긴 서주부가 붙는 등 교향곡 제5번과 제6번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진 느낌이 있다. 전 곡에 걸쳐서 리듬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데 느린 2악장까지 비교적 템포가 빠르고 리드믹하며, 각 악장마다 특징있는 매력적인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트가 이곡을 가르켜 "리듬의 화신"이라 했고, 바그너는 [춤의 성화(聖化)]라고 하면서 밝고 명쾌한 이 작품을 높게 평가하였다. 동시에 이 곡에는 강한 의지나 음악의 주장에 대한 관철이라는 요소도 존재한다. 교향곡 3번이 귓병에 대한 절망을 떨치고, 5번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느낀 실망감에서 작곡하였다면, 7번은 전쟁과 실연의 극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곡은 1811년 가을부터 작곡하기 시작하여 다음 해 5월 완성되었다. 그의 교향곡이 완성된 해를 되돌아 보면, 제1번이 1800년에, 제2번이 1802년, 제3번이 1804년, 제4번이 1806년, 제5번이 1807년에서 1808년, 제6번이 1808년에 각각 완성되었다. 제7번은 그 전 교향곡인 6번(1808년 완성) 작곡 이후 3년 이상 교향곡 작곡에서 멀어져 있던 셈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베토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화를 겪게된다. 먼저 1809년 5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전쟁으로 나폴레옹 군대가 빈을 침입하였는데, 이 때문에 베토벤의 후원자들이 빈을 피해 도망을 가 베토벤은 재정적 후원을 받지 못했으며,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창작이 생각되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해 11월 나폴레옹 군대가 물러가 다시금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고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1809년 무렵 베토벤은 테레제 말파티라는 대지주의 딸을 알게된다. 1810년 베토벤은 테레제를 위해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 하였는데, 이 둘의 관계는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 등으로 결국 파국으로 끝난다. 1811년에 접어들어 베토벤은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휴양을 위해 온천이 있는 테프리츠로 간다. 이 곳에서 안정을 되찾은 베토벤은 다음해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실연 후 조금은 투쟁적으로 변모해 있던 베토벤은 테프리츠에서의 생활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런 즐겁고 밝은 기분이 교향곡 7번 작곡에 반영되었다. 사실 1811-1812년의 작품은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거의 밝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작품 활동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명작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현악4중주 내림마장조(op.74), 바단조(op.95), 극음악 에그몬트(op.84), 슈테판왕 서곡(op.117), 아테네의 폐허(op.113), 피아노 소나타 올림바단조(op.78), 내림마장조 <고별>(op.81a), 피아노4중주 라장조와 내림마장조(op.70), 피아노3중주 내림나장조 <대공>(op.97)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작곡과 초연 베토벤의 스케치 북에 의하면 제 7번 교향곡은 늦어도 1811년에 착수된 듯하다.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812년에 들어와서부터라고 전해진다. 제 2악장의 스케치는 이보다 앞선 1806년 현악사중주 작품 59-3의 작곡 중에 발견된다는데 아마도 처음엔 이 현악사중주에 쓸 작정이었던 모양이다. 이 곡의 완성은 1812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현재 베를린의 므로시아 국립 도서관에 있는 자필 악보의 표지에 <7 Symphonie 1812 ... 13 ten>이라고 적혀있는데 몇월인지는 파손 때문에 알 수 없지만 5월 13일인 것으로 추리된다. 베토벤은 1813년 2월에 공개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비공개의 초연은 1813년 4월 20일, 빈의 루돌프 대공의 저택에서 8번 교향곡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1813년 12월 8일 빈 대학 강당에서 메트로놈을 발명한 멜첼이 주최한 <하나우 전쟁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에서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공개초연되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소위 "전쟁 교향곡"이라 불리우는 <빅토리아 회전과 웰링턴의 승리> op. 91과 교향곡 8번 op. 93도 같이 초연되었다. 연주회의 성격상 애국적인 기세가 높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초연은 대성공이었다. 교향곡 7번보다 <전쟁 교향곡>이 더 큰 인기를 받긴 했지만 7번도 대호평이었으며 선율이 아름다운 제 2악장은 앙콜을 받기까지 했다. <전쟁 교향곡>과 교향곡 7번이 너무 인기가 높아서 결국 4일 뒤인 12월 12일에 재연되고 이듬해 1월과 2월에도 계속 연주회가 열렸으며 그 때마다 제 2악장은 앙콜되었다고 한다. 초연부터 대호평을 받았다는 것은 이 곡의 대중성을 그대로 들어내보이는 것으로 한번만 들어도 귀에 곧 익숙해지는 악상 (2악장)과 함께 베토벤 특유의 넘치는 위트 (3악장)와 무엇보다도 광란에 넘치는 1악장과 4악장의 매력이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했으리라고 생각된다.
|